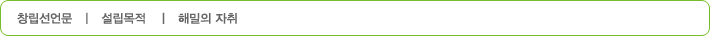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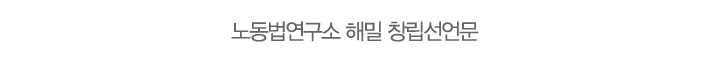
‘아직도 노동법을 하느냐’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
누군가는 심지어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법이 아니라 투쟁과 운동의 영역이 아니냐’고 말하기도 합니다.
또 다른 누군가는 그동안의 노동법이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힘 있는 노조의 도구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
하지만 ‘노동 없는 민주주의’의 상처가 깊은 지금이야말로, 더더욱 노동법을 해야 한다고,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노동법의 가치가 필요한 때라고, 노동법은 죽은 법이 아니라 펄떡거리며 살아 숨 쉬고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,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
시민법 질서와 계약자치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, 단체협약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, 장시간 근로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위법할 수 있다는 것,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, 노동관계의 상대방은 노동자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조직체라는 것, 파업을 벌이는 일이란 마치 표현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 등등 … 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노동법이야말로,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, 소유하는 자가 소유하지 않는 자를 지배하는 불합리한 자연 상태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, 그래서 법률이 사람과 사회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규범이라고 생각하는,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
누군가는 우연히, 누군가는 충격적인 경험에서, 누군가는 무언가를 마음먹고 찾아 헤매다가 노동법을 만났습니다.
그리하여 몇몇은 곧바로, 다른 몇몇은 뒤늦게 그 매력적인 세계에 빠져 버렸습니다.
그렇게 노동법이 안겨준 첫 사랑의 설렘을 잊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마침내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.
그 만남이 그저 한 순간의 추억이나 어리석은 후일담이 되지 않도록, 이제 『노동법연구소 해밀』을 창립하려 합니다.
여기서 우리는 모두, 노동법이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자르고 쓸고 쪼고 갈아나갈 것입니다.
노동법으로 세상에게 말을 걸고,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.
그렇게 찾은 노동법의 참모습이, 공허한 담론과 추상적 이념의 언어가 아니라, 힘 있는 울림으로 노동의 문제가 있는 곳에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애쓸 것입니다.
이런 우리의 하나 된 참 뜻을 여기에 담아 깊은 마음으로 새겨 다짐하고자 합니다.
2012. 12. 20.
노동법연구소 해밀 창립회원 일동
| 